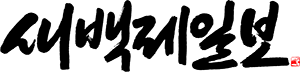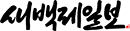<문경근칼럼>눈 내리는 내장에서의 단상


하얗게 뒤덮인 내장산은 기대했던 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봄 벚꽃, 여름 녹음, 가을 단풍에 이어, 겨울의 설경이 그 배턴을 받았습니다.
계절의 마지막 주자인 설경은 내장산 4계의 완성품이나 다름없습니다.
늘 그랬듯이 내장산은 자연의 착한 순리에 따라 사람들에게 쉼 없이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내장산의 산천초목은 온통 하얀 눈을 뒤집어쓴 채 정적과 정결 모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 밤 사이에 이렇듯 조화(造化)를 부릴 수 있는 것은 자연 말고 또 있을까? 자연이 위대하다는 말은 그냥 나온 수식어가 결코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감과 눈은 서로 어울리며 빨간 색은 한층 돋보이게 하고, 흰색은 더욱 눈을 시리게 합니다.
한 겨울의 삭풍에도 끄떡없이 매달려 있는 감들은 겨울새들의 밥이 될 때까지는 도도한 자태로 으스댈 것입니다.
내장산은 한 달여 전만 해도 오색으로 단장하고 사람들을 불러들였는데, 이젠 내려놓을 것은 남김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벗을 것도 깔끔하게 벗어버렸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나무들은 오히려 더욱 짱짱하고 건강해보입니다.
간간이 내리는 함박눈을 뒤집어쓰며 쉼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봅니다. 그렇지만 자연이 빚어놓은 설경을 하찮은 물건 안에 담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과욕이며, 턱없이 미미한 손짓에 불과합니다.
산책길 옆의 눈밭 위에 겨울 의자 하나가 동그마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님들의 수다가 수없이 흩어졌을 그 자리엔 백설의 침묵이 살포시 앉아 있습니다. 잠시 발길을 멈추고 일상으로 혼잡스러워진 마음을 겨울 의자에 잠시 앉혀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심신이 조금은 정갈해집니다.
설경은 삶에 쫓기거나 지친 사람들을 차분한 사색의 시간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좀 더 깊은 생각까지 미치면 잃어버렸던 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박노해 님의 시 한 구절처럼…….
여행을 떠날 떈 혼자 떠나라./ 함께 가도 혼자 떠나라./ 그러나 돌아올 땐 손잡고 오라./ 낯선 길에서 기다려 온 또 다른 나를 만나/ 돌아올 땐 둘이서 손잡고 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