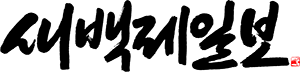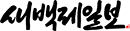<문경근 칼럼> 속 좋은 호박 이야기

기세 좋게 뻗어가던 호박 덩굴도 지나가는 개구쟁이의 수도(手刀)에 걸리면, 덩굴의 끝은 힘없이 길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때로는 애꿎은 애호박의 얼굴을 긁어 치명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은 한술 더 떠 호박꽃도 꽃이냐며 무시해버립니다.
굳이 줄을 그으면서까지 호박은 수박이 될 수 없다고 폄하하는 속담에 이르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애초부터 호박과 수박은 서로 모양으로 맛과 쓰임새가 다른 존재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같은 반열에 놓고 선악을 따지듯 비교하려 하다니,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호박은 사람들에게 할 만큼 했는데, 유독 속담 속에서만은 푸대접을 받고 있으니, 호박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호박은 이런저런 구박을 당하면서도 굳건히 덩굴을 뻗치고 꽃을 피워 사람들에게 잎과 열매를 줍니다.
긴 장마 통에는 물론 어지간한 가뭄 중에도 끄떡없이 자라서 푸짐한 열매를 맺는 것이 호박입니다.
그리고 화려함이나 향기로움이 아닌 실속과 넉넉함으로 승부를 겁니다.
요즘도 시골에서는 여전히 그러하지만, 호박은 이웃끼리 아무 조건 없이 주고받는 인정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호박은 참 소탈하면서도 속 좋은 작물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를 기다리면 호시절이 오는 법. 요즘 호박은 웰빙식품의 대열에 들어서면서, 마트 진열대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나는 길에 그냥 뜯어가도 괜찮을 정도로 인심 좋았던 호박잎도 이젠 제값을 주어야 밥상 위에 올릴 수 있습니다.
가을철의 늙은 호박은 내공의 연륜과 근엄한 자태로 건강식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호박처럼 쓰임새가 많고 옹골찬 작물은 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호박에 대한 부정적인 속담들도 슬며시 꼬리를 감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호박은 호박다우면 되는 것이니까요.
밝은신문
cibank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