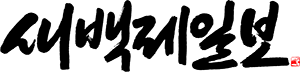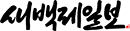<문경근칼럼>작은 길도 사연이 얹히면 정겨워지는 것
그런가 하면 조금은 느리지만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작은 길에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상반된 풍경 속에는 현대인들의 속도와 여유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길, 숲길, 고샅길, 골목길, 오솔길, 논길…….
나이 든 이라면 어린 시절 누구나 걸어보았던 정겨운 우리 길입니다.
그 중에도 겨울이 되면 그 시절의 하얀 눈길이 먼저 떠오릅니다.
연초에 운 좋게도 그 길을 다시 걸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지난밤에 내린 눈과 얼어붙은 길 때문에 산행 대신 부득이 평지를 걷기로 했습니다. 이왕이면 시내를 벗어난 눈길을 걸으며 겨울 낭만을 즐겨보는 것이 제격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행은 마치 내 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나와 인연이 있는 경로를 택해주었습니다.
벌써 반세기도 넘은 그 시절, 두둑이 받을 세뱃돈 생각에 가슴 설레며 어머니를 따라 쫄랑거리며 걸었던 바로 그 길입니다.
거기다 퇴임 직전 근무했던 마지막 학교를 반환점으로 정했으니, 나로서는 썩 괜찮은 테마라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외갓집 마을로 이어졌던 구불구불 논길은 지금은 자동차가 너끈하게 달릴 수 있는 농로로 변해 있습니다.
길 양편에 펼쳐진 논밭은 하얀 눈을 소복이 덮은 채, 봄 농사를 위한 내공을 쌓고 있는 듯 드러누워 있습니다.
일행은 눈 덮인 큰길과 논길을 번갈아 걸으며, 간간이 미끄덩거리기도 하고 엉덩방아를 찧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까르르 웃어대는 모습은 영락없는 아이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나는 눈밭에 벌렁 누워 눈 사진을 찍어볼까도 했지만, 몸을 던지는 폼만 재고 말았습니다. 눈길이 동심을 깨워주고, 그 동심은 행복이란 이름이 되어 일행의 얼굴에 내려앉습니다.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사라져 마음만은 쌓인 눈만큼이나 순백이 되어 가는 듯합니다.
외갓집 마을을 감돌아 지나니, 두 해 전 마지막으로 몸을 담았던 학교의 건물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교문을 들어서자 온통 하얀 눈으로 덮인 운동장과 정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유달리 정 많던 선생님들과 순박하기 그지없던 아이들의 잔상이 눈밭 위로 잠시 스쳐갑니다.
방학 중 근무 중이던 친절한 선생님이 권하는 따끈한 차 한 잔에 얼었던 심신이 절로 녹아내립니다.


나만의 추억 속 이야기를 꺼내어 나 홀로 만끽했으니 말입니다.
간간이 지긋이 미소 짓는 이유도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테니, 그것 또한 고소합니다.
쫓듯 쫓기듯 서둘러 달리던 큰길을 떠나, 때로는 작은 길을 찾아 걷다보면 뜻밖에도 얻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하찮은 물건도 정이 얹히면 소중한 물건이 되듯, 작은 길도 사연이 내려앉으면 정겨워지는 가 봅니다.
어린 시절 코흘리개 동무들과 뛰어다니던 고향의 고샅길을 가끔 걸어보는 것도, 초등학교 시절의 등하굣길을 일부러 달려보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문경근주필
dall43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