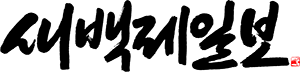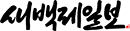<문경근칼럼>논에서 배우고, 벼에서 깨치다
양식 주는 것도 모자라, 덤으로 사람사는 이치도 보여줘


이제 논바닥은 깡마른 맨몸을 드러낸 채, 다시 땅심을 기르기 위한 긴 동면으로 들어갑니다. 탈탈거리는 이앙기가 무논에 내려놓은 어린모들이 한동안 부대낄 때는, 저게 언제 자라서 양식이 되나 했습니다. 그러나 모진 비바람과 타는 가뭄도 견디며 포기를 살찌우고 논을 채웠습니다.
가끔 들여다보며 물이 부족하면 채워주고 거름이 모자라면 뿌려주는 농부의 정성과 땀에 보답하듯, 논은 군소리 없이 몸집을 불리면서 실하게 만들어진 결실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성급한 농부가 양식이 모자란다고 재촉해도, 벼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순서를 다 채웁니다.
요즘의 제반 사회 현상에는 속성(速成)의 과욕으로 건너뛰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벼는 이를 거부하며 그들 나름의 순서에 따라 묵묵히 자신을 익혀갑니다. 때로는 가로등 밑에 있는 벼들이 제대로 익지도 못한 채 미리 고개를 숙이기도 한다지만, 그건 자연의 순리를 거치지 않은 건너뛰기의 탓입니다.
논은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것도 모자라, 덤으로 사람 사는 이치도 보여줍니다. 속성(速成)에 휩쓸리지 않는 순리, 뿌린 땀만큼 거두는 정직, 익을수록 숙이는 겸손이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자연이 그렇듯이 논도 일부러 사람들을 가르치려들지는 않습니다. 그걸 보고 스스로 깨우치는 것은, 사람들의 몫이니까요.
이 가을에도 논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심을 시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덤 값은 괜찮으니, 제 값이라도 쳐주세요.’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