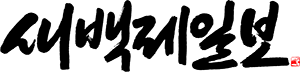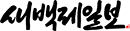<문경근 칼럼>바다와 우리나라 지도를 처음 보았던 그곳에 다시 서다

이런저런 수식어들에서 보듯, 평지에 우뚝 솟은 두승산은 가진 것이 참 많은 예사롭지 않은 산입니다.
그러나 두승산이 나에게 특별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 집 마루 끝에 걸터앉으면 멀찌감치 두승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다가서기도 하고, 때로는 아스라이 멀리 물러나 있기도 했습니다.
가깝거나 멀리 보이는 것은 날씨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시절 두승산은 호기심의 대상이었고, 우리 집을 포함한 큰 그림 속의 한 부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들에서 일하던 농부들도 두승산이 어두컴컴해지면 어김없이 비가 내린다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나와 두승산과의 직접적인 인연은 초등학교 소풍 때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막연했던 궁금증도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두승산은 우리학교 5,6학년 소풍의 단골 장소였습니다. 십여 리를 걸은 뒤 가파른 산을 기어오르다시피 하여 올라갔으니, 요즘 아이들 같으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소풍은 원족이라 하여 먼 길을 걷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해가 질 무렵에야 끝이 났지만 원족은 당연히 그런 거려니 했습니다.
두승산 소풍 길에 나서기 전에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잔뜩 바람을 넣었습니다.
“산봉우리에서 보면 뒷모시방죽(그때 우리끼리는 그렇게 불렀음, 지금의 고부지)이 꼭 우리나라 지도처럼 보일 테니 기대하렴.”
그리고 한 마디 더 붙였습니다.
“운이 좋으면 서해 바다도 볼 수 있고……”
숨을 헐떡거리며 산을 오른 것도 아마 그 희한한 구경을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반신반의 했지만 선생님의 말씀은 딱 들어맞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뒷모시방죽은 영락없는 우리나라 지도 모양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서쪽으로 흰 천을 깔아놓은 듯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해 바다였습니다.
그때 나는 멀리서나마 생전 처음으로 바다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두승산에서의 첫 경험은 어린 나에게는 충격이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내 머리 속에 화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고향 학교의 새내기 선생이 된 나는, 소풍날이면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두승산에 오르면 우리나라 지도 모양의 저수지도 보이고, 바다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들의 소풍 길을 재촉했습니다.
산 위에 도착해서는 눈앞의 현상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며 신바람을 냈습니다.
초등학교 때처럼 고목나무 부근에서 보물찾기와 오락회도 가졌습니다.
초등학생 때 시작한 나와 두승산과의 인연은 교사가 되어서도 그렇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 요즘은 운동 삼아 지인들과 가끔 두승산 산행에 나섭니다.
엊그제는 두승산의 봄이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는지 미리 찾아보자는 명분으로 나섰지만, 실은 나만의 생각이 따로 있었습니다.
봄을 핑계로 추억을 만나고자 하는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카메라를 따로 챙긴 이유도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만 발밑에선 촉촉한 봄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정상에 이르러 탁 트인 시야를 마주하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막힘도 조금의 가림도 없었습니다.
너른 들판, 옹기종기 정겨운 마을, 나지막한 야산, 흰 빛깔 저수지, 그 사이를 감도는 길, 그리고 저 멀리 바다까지……. 이처럼 빙 둘러 펼쳐진 풍광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니, 이는 두승산만이 줄 수 있는 넉넉한 선물입니다.
소위 명산이라고 일컫는 다른 산과 견주는 것은 결코 두승산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산봉우리에 자리 잡은 절은 예전에도 그랬듯, 한적하기 그지없고 간간이 울리는 풍경소리만이 고찰의 정적을 흔들었습니다.
절 옆의 노목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노익장을 과시하며 버티고 서있었습니다.
북쪽으로 물을 가득 담은 저수지를 내려다보니 부분적으로 모양새가 예전과 조금 달라진 듯 보였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지도 모양을 닮아 있었습니다.
엷은 안개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서쪽의 너른 평야 건너편에는 희미하게나마 바다가 내려다보였습니다.
이맘때쯤이면 그 바닷가 어시장에서는 싱싱한 쭈꾸미가 꾸물꾸물 사람을 유혹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한동안 그 시절 소풍 터에 머물며, 마음은 옛 시간 속으로 거슬러 달렸습니다.
그 안에서 선생님도 뵈었으며, 깨복장이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만났습니다.
두승산의 봄기운 때문에 몸은 가뿐하고, 추억거리와의 만남 덕분에 가슴 따뜻한 한나절이었습니다.
이렇듯 나와 두승산의 인연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문경근 주필
dall4321@hanmail.net